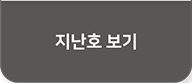플러스 엣세이 - 선택의 기로에 선 전기산업
플러스 엣세이는 사회저명 인사가 기고한 글입니다.
기업연구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1990년대 들어 이전세대 연구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대두된 전사적인 연구개발 시스템인 ‘3세대 R&D’가 시작되었다.
즉, 중앙연구소는 신사업을 위한 제품개발과 공통기술의 연구를 담당하고 사업부의 연구소는 해당 사업부 제품의 성능개선이나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확보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이 정의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주로 ICT, 인터넷 기술과 같이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며 기존산업을 파괴하는 성격을 가진 기술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소위 시장창출형 연구개발이 중요한 역할로 대두되었고 이를 연구소 체계에 반영한 것이 ‘4세대 R&D’이다.
이와 같이 기존산업의 혁신과 시장창출형의 혁신 두가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을 ‘양손잡이형 R&D’라고 부른다.
과연 우리나라 산업들은 몇세대의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동차산업의 경우 국내 자동차회사가 기존시장인 가솔린자동차에서 핵심기술인 엔진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세계 톱 수준에 근접하는 성공을 해왔다. 3세대 R&D에서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 친환경차 기술전쟁이 시작되면서 시장파괴가 진행 중이다. 이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청정디젤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시장에 보급되고 있다.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속속 들어올 경우 가솔린자동차의 세계 톱 수준이라는 위치는 쉽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가 있다.
들리는 얘기로는 국내 자동차회사는 연료전지 자동차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이 자동차가 도미넌트 디자인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양손 중에서 한손인 시장창출형 혁신이 국내 자동차회사가 직면한 문제이다.
반면에, 전기산업은 아직도 기존산업에서 세계 톱 수준에 올라가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의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전기산업도 기술도입을 통해 폐쇄적인 국내시장에서, 특히 기업간 경쟁이 한동안 배제된 채로 사업을 영위하다보니 자체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못한 상태로 지내왔다.
2000년대부터 포화된 국내시장을 극복하고자 해외로 진출하면서 자체 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제품 자체가 B2B 성격의 고신뢰성을 요구하며 제품개발도 고도의 연구역량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데다가, 구매자들이 자체개발 제품에 대한 불신과 선진기업의 기술수준에 대해 과도한 숭배의식으로 인해 자체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세계시장에서 변압기, 차단기, 모터 등 주요제품의 시장점유율이 1~2%에 불과하고 기업순위는 대부분 10위권 밖이다.
자체개발에 성공한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요소이고 이를 위해서는 성공하기까지 불굴의 도전을 하는 연구개발진과, 최고경영진의 과감한 자원의 투입뿐 아니라 고비고비마다 끊임없는 후원이 필수적이다.
현대자동차의 자체 엔진개발 성공사례를 보면 이런 점을 잘 알 수 있다. 이 자체기술 확보에 성공하면 세계적인 톱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고 세계적으로 우수기업들이 누리는 고수익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기산업은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산업과 마찬가지로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라는 시장파괴적인 기술혁신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기존사업에서 세계수준을 따라잡는 일과 신시장 창출을 동시에 해야 하는 딜레마를 갖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한마리의 토끼를 제대로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국내기업이 이 둘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쉽지않다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기존사업에서 수십년을 노력해 왔으나 세계시장에서의 위상이 미미하니 신재생과 스마트그리드에 배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얼마전에 내한한 제레미 리프킨이나 지멘스의 조 캐저 회장이 공히 언급한 대로 한국이 ICT 분야에서 이룩한 세계 톱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이 또한 두가지 제품의 혁신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기산업이 여하히 ICT 기술을 흡수해서 산업의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전기산업계의 분위기를 보면 신재생이나 스마트그리드를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로 보지 않고 더나아가 ICT 기업에게 파이를 뺐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서서 오히려 배척하는 분위기가 더 많지 않나 생각된다.
두마리 토끼를 다잡을 것인가? 한마리에 집중할 것인가? 어떤 토끼를 잡을 것인가? 한국의 전기산업이 당면한 숙제이다.